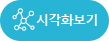| 항목 ID | GC06600397 |
|---|---|
| 한자 | 小作制度 |
| 이칭/별칭 | 병작반수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 집필자 | 문경호 |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일정 분량의 지대를 받았던 경작제도.
[개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대규모 토지와 지세 수입을 장악한 일제는 1920년대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였다. 산미증식계획으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소출의 70~80%를 지주에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증가하면서 소작농의 비율은 더욱 늘어났고, 농지가 많은 예산 평야 지대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심하여 소작농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소작제도의 기원과 형성]
우리나라의 소작제도의 기원이 삼국시대부터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작제도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진전을 개간하는 경우 첫 1~2년간의 수확물을 개간한 사람이 모두 갖고, 그 다음부터는 토지의 주인과 절반씩 나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당시 지주를 전주라고 불렀으며, 소작인은 전호라고 하였다. 고려 말에는 소작제도가 더욱 확산되었다.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전법에서는 병작반수를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시킬 때는 조를 생산물의 1/10만 거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지를 겸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토지 매매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명종 대 이후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리들의 농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넓힌 농장을 병작(並作)이라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병작이란 토지 주인과 농민이 농사를 지어 절반씩 나눈다는 의미이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도지라는 새로운 종류의 소작제도까지 생겨나 점차 확산되었다.
[소작제도의 종류]
일제강점기의 소작제도에는 일반 소작과 특수 소작이 있었다. 일반 소작은 소작농의 권리가 배제된 것이고, 특수 소작은 도지권 등 소작농의 권리가 일부 허용된 것이었다. 일반 소작은 다시 소작료 징수 방식에 따라 정조법 소작, 타조법 소작, 집조법 소작으로 나뉘었다. 정조법은 조선 후기의 도조법과 같은 방식으로 소작농이 해마다 지주에게 납부할 양을 협정한 후 풍흉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는 정액지이다. 반면, 타조법 소작은 해마다 수확량을 파악하여 지주와 소작농의 입회하에 정해진 비율만큼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약정한 소작료율에 따라 징수하는 소작제도이다. 집조법은 곡식이 아직 논이나 밭에 있을 때 지주와 소작농의 입회하에 작황을 파악한 후 수확 예상량을 추정하여 약정한 소작료율에 따라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작률은 약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소작료는 해마다 풍흉에 따라 변동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농회가 편찬한 『조선의 소작관행』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전국의 토지는 논에서 정조법이 24.2%, 타조법이 50.8%, 집조법이 25%의 비율로 행해졌으며, 밭에서는 정조법이 50.9%, 타조법이 46.4%, 집조법이 2.7%의 비율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1930년대에 접어들면 집조법과 타조법 소작이 점차 정조법 소작으로 바뀌는 일이 많았다. 논은 집조법 소작이 정조법 소작으로 다수 변환되었으며, 밭은 타조법소작이 정조법 소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소작농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간의 마름이나 고지의 횡포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소작료와 소작 조건]
일제강점기의 소작제도에서 소작료율은 대부분 늘어났다. 조선 말의 경우 도조법 소작률은 생산량의 약 33.3%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도조법이 적용되면서 정조법 소작에서는 소작률이 55~60%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는 양은 대체로 절반 정도씩이었지만 타조법 소작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작료율이 생산량의 50%였으나 지주들이 종자 개량비, 비료 대금, 수리조합비 등까지 전호에게 떠맡김으로써 농민들의 실제 부담량은 65% 이상으로 늘 과중하였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소작료의 소작율은 55~60%의 범위에 있었다. 이것은 조선 말의 소작료인 33~50%에 비하면 상당수가 증가한 부분이었다. 일제는 공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로 인해 도시 노동자들이 값싼 농산물을 들여가야 하였다. 일제는 공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식량을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55~60%를 현물 소작료로 징수하였다.
소작제도는 1945년 8.15광복 이후 개정이 논의된 이래 1950년 농지개혁의 추진으로 법제상 모두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 예산 지역의 소작제도]
1910년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많은 국유지와 미신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지주의 토지 사유권을 배타적인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반면, 소작농이 전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경작권, 도지권, 개간권, 입회권 등의 모든 권리는 부정하였다. 이는 일제가 지주 세력을 식민통치의 협조자로 인정하는 한편,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에 진출하기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한국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소작농들은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일본 내에서 공업화가 진전되어 곡가가 상승하자 일제는 자국의 곡가 안정을 위해 한반도에서 쌀을 증산하여 증산량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미곡 생산을 증산시켜 증산량만큼 일본으로 수출하겠다는 주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훨씬 더 많아 국내에서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소작농들은 기존의 50% 소작료 외에 수리조합비, 비료 대금, 종자 개량 비용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소출량의 70~80%를 수탈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침략 전쟁의 수행을 위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만드는 한편, 경제 공황 이후 부족해진 공업원료의 생산을 위해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수확을 싼 값에 수탈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착취로 인해 농민들이 몰락하여 소작농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지가 많은 예산 평야 지대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심하였다. 1930년 11월 18일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1930년 10월 1일자를 기준으로 지주는 1.55%, 자작농은 7.9%, 자소작농은 29.07%, 소작농은 61.48%였다고 한다.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작제도